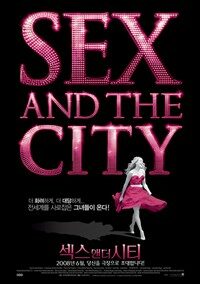|
사랑이라니, 선영아 김연수 지음/작가정신 |
영화 <섹스앤더시티>를 보러 가는 내 가방 안에 김연수의 <사랑이라니, 선영아>가 들어있었다. 나는 작가 김연수에 빠져들고 있는 중이였고, 그건 내가 읽은 그의 네번째 책이었다. <사랑이라니, 선영아>은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건 팔레노프시스 때문이었다고 광수는 생각했다.' 소설의 주인공인 광수는 자신의 결혼식날 신부의 부케 속 줄기가 부러진 팔레노프시스를 보곤 마음이 복잡해진다. 왜 멀쩡한 팔레노프시스가 꺾여졌는가. 왜 하필 내 아리따운 신부가 예전에 끔찍히도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친구인가.
영화를 보면서 내내 그 문장을 생각했다. '모든 건 팔레노프시스 때문이었다고 광수는 생각했다.' 왜 티비에서는 꽤 근사해보였던 40대 섹스앤더시티 언니들의 과도한 메이크업이 커다란 스크린 위에서는 그리 거북했는지를 1시간 넘게 골몰했던 극장 안 내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끊이지 않고 떠올랐는가. 캐리가 언제나 그렇듯 덩치에 안 어울리게 비겁한 빅에게 팔레노프시스는 아니더라도 화려한 부케를 휘둘러 산산이 부서진 꽃잎을 아스팔트 위에 흩뿌릴 때도 나는 그래, 팔레노프시스 = 부케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다. 그건 내게 생소한 꽃의 이름, 팔레노프시스라는 단어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에 깨달았다. 그건 단어 '팔레노프시스' 때문이 아니라 '모든 건 A 때문이었다고 B는 생각했다' 라는 문장 전체 때문이었다는 걸.
그러니까 이런 식이다. 결국 결혼에 실패한 건 (아니, 화려한 결혼'식'에 실패한 건) 전날 파티에서의 일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미란다때문이라고 캐리는 생각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어지자면 진작에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던 미란다에게 그건 옳지 않는 방법이라며 저지했던 샬롯때문에 미란다는 그렇게 행동한 거다. 돈도 많고 기름기 넘치게 여유롭지만 늘 캐리 앞에서는 비겁하기 일쑤였던 빅에게도 할 말은 있을 거다. 이 모든 건 덩치에 맞지 않게 떨리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던 결혼식 아침 캐리가 전화를 받아 괜찮아, 우리 완벽해, 라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빅은 생각할 거다. 뭐든지 그런 식이다. 캐리네 사람들은. 그리고 그건 스크린 바깥 우리네 사람들도 마찬가지. 늘 그건 그 사람, 그것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원인은, 문제는, 극복해야 할 대상은 내 안에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는 거다. 그걸 발견하고 도려내고 미련없이 버려내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른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서른이 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듯. 어른이 되는 건 정말 심장(아니 신장 정도)을 도려내는 아픔을 견뎌내야만 하는 거다. 고개를 숙여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이렇게 많은 '때문에'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언니들이 돌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언니들은 내게 실망감만 그득히 안겨주었다. 오직 사랑, 엘.오.브이.이만을 외치는 언니들은 정말이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개봉날, 전석이 꽉찬 극장 좌석의 맨 뒤에 앉아서 캐리네 언니들을 올려다보며, 언니들을 보려온 수많은 여성들을 내려다보며 의심했다. 내가 그렇게 열광했던 브라운관의 섹스앤더시티는 어디갔느뇨. 브라운관의 언니들도 늘 이렇게 사랑만을 외쳤던가. 근사한 철학사상을 찾았던 건 아니었지만, 언니들은 늘 내게 30분을 넘기면 어떤 사소한 깨달음을 던져주었다. 늘 오르가즘을 느끼는 친구도 어머니를 잃은 친구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 전까지는 절대, 어떤 탄탄한 근육의 상대와도, 어떤 기묘한 자세로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 없다는 걸. 포스트잇으로 이별의 메세지를 전하는 남자와 끝낸 후엔 거리에서 대마초를 피워도 눈 감아줄 경찰이 있다는 걸. 정말로 사랑했던 그 사람은 나와 기필코 결혼하려 했지만 그 사람은 결국 결혼이라는 안정적인 제도를 원했던 것이지 나를 원했던게 아니었다는 걸. 스크린 위의 언니들은 너무 늙어보였고, 너무 지쳐보였다. 사랑, 만을 정열적으로 외쳐대기엔 너무 많은 나이였다. 그 나이에는 사랑따위는 가뿐히 즈려밟는 여유가 돋보이는 건데 말이다.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영화 <섹스앤더시티>를 보는 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사랑이라니, 선영아>에서 두 번 읽었던 구절.
하지만 사랑이 끝나면 이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다. 사랑의 종말이 죽음으로 비유되는 까닭은 그 때문이다. 사랑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원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데, 그러면서 무한히 확장됐던 '나'는 죽어버린다. 진우의 말처럼 한 번 끝이 난 사랑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죽음은 비가역적인 과정이다. 사랑의 종말도 그와 마찬가지다. 확장이 끝난 뒤에는 수축이 이어지게 된다. 사랑이 끝나게 되면 우주 전체를 품을 수 있을 만큼 확장했던 '나'는 원래의 협소한 '나'로 수축하게 된다. 실연이란 그 크나큰 '나'를 잃어버린 상실감이기도 하다.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에 걸쳐진 이야기. 2003년의 김연수의 말이다. 소설에도 빅같이 비겁한 주인공이 등장하긴 한다. 아내의 예전 남자친구, 즉 자신의 친구와 아내가 잤느냐에 골몰하는 사내가. 결국 모든 건 꺽여진 팔레노프시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내가. 여전히 너무 아픈 이유로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다. 나도 그대들도. 사랑의 기쁨도, 사랑의 아픔도 초월하는 근사한 어른이 되는 길은 너무 멀고 험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