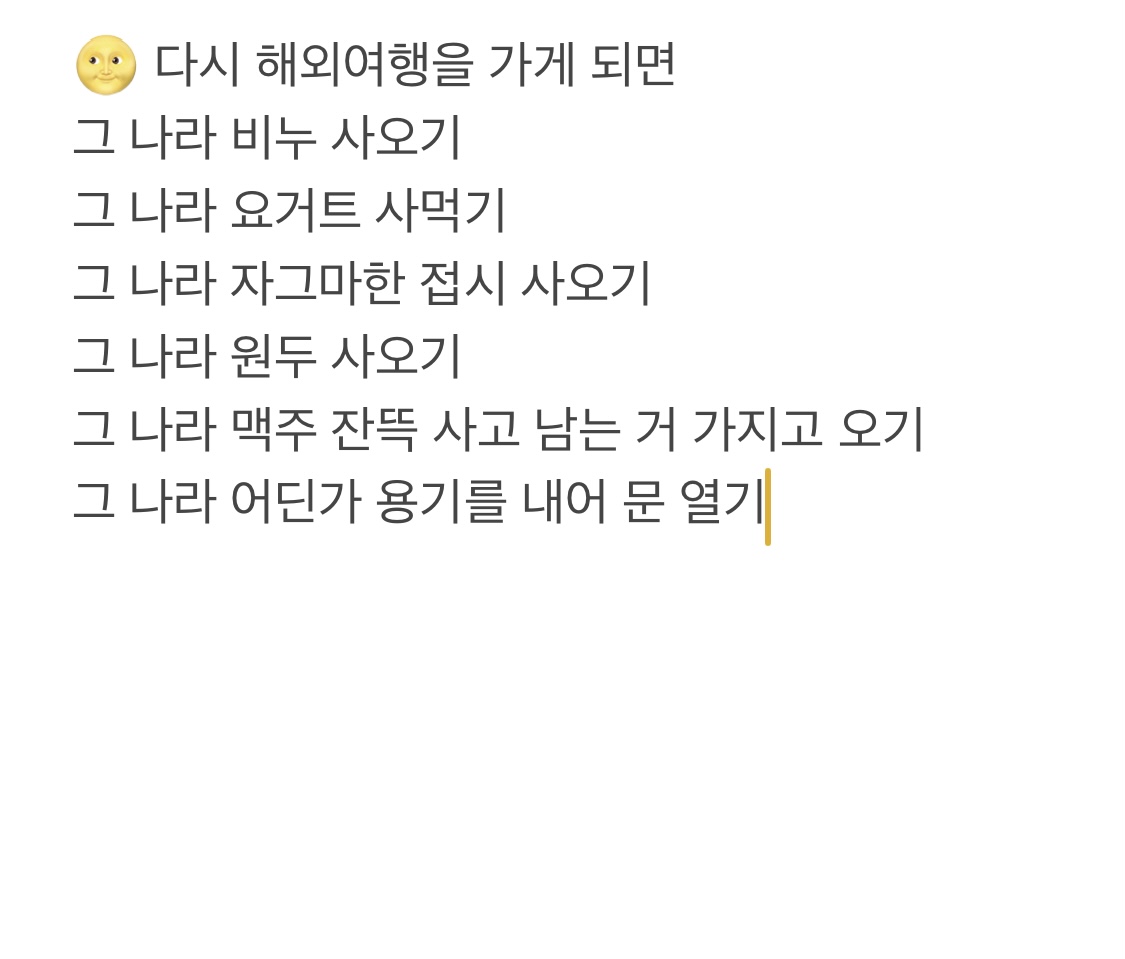남편이 말했다. "우린 지금 살얼음판이야." 육아를 시작하고부터 우리에게 여러 인내의 순간들이 찾아왔다. 남편이 참는 경우, 내가 참는 경우, 둘다 어찌어찌 참고 넘어가는 경우, 둘다 정말 못참겠는 경우. 물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로 인해 행복하고 충만한 순간이 더 많다. 어쩌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조차 생각나지 않는 살얼음판의 순간이 오면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든다. 내가 이러려고, 로 시작하는 생각들. 남편도 그럴 것이다.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어떨 때는 밤이 지나기도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예민했었다 생각이 들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정말 육아는 녹록치 않다. 마음과 몸이 동시에 지치니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말 한마디로 살얼음판을 오르내린다. 얼마 전 영화 <보살핌의 정석>을 봤는데 이런 대사가 있었다. 만삭의 임산부가 묻는다. "부모가 되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아빠가 대답한다. "귀에 박히게 들었던 아이 얘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더군요." 정말이다. 진짜 그렇더라. 그동안 우리는 정말 해맑은 신혼이었다.
인내의 순간 중에 서로를 걱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순간들도 있다. 그런 순간들이 있기에 남편이 참는 경우, 내가 참는 경우, 둘다 어찌어찌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팔월에 두번째 결혼기념일이 있었다. 첫번째 결혼기념일에는 부러 날짜를 맞춰 여행을 갔지만 올해는 둘다 완전히 까먹고 있었다. 결혼기념일 당일 아이를 안고 집안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달력을 보고 알았다. 헐,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었어, 라고 카톡을 보냈고 남편도 헐, 이라고 답장이 왔다. 그러고나서였나보다. 좋아하는 동네꽃집은 수요일마다 미니꽃다발을 오천원에 파는데 수량이 정해져 있다. 예약도 받는다. 이번주 꽃다발이 무엇인지, 예약은 얼마만큼 되었는지 게시물과 댓글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질문을 한 댓글이 보였다. <꽃다발 예약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알아서 예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격도 말 안하고 알아서 해달라니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고 넘어가려는데 아이디를 이상하게 읽어보고 싶어지는 거다. 전...용... 퇴근 즈음 아이와 유모차 산책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멀리서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왔다. 나는 어머머 왠 꽃다발이냐며 남편의 서프라이즈를 끝까지 지켜줬다.
어느 주말이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고 나는 안방에서 티비를 켜고 <놀면 뭐하니>를 보고 있었다.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면 커피숍에 갈게, 나를 찾지마, 하고 안방에 들어간다. 물론 당연히 혼자만의 시간이 될 리 없지만 코로나 시대 한적한 숲세권 동네에 사는 내겐 이것이 최선인 것이다. 그 날 <놀면 뭐하니>는 느닷없이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는 몰래카메라였는데 정준하 편이 너무 웃겨 정말 간만에 큰소리로 숨 넘어가게 웃었다. 눈물이 찔금 날 정도로 웃고 있으니 남편이 거실에서 달려오더니 아이가 자니 조용히 하라며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쉿쉿을 반복했다. 나는 그러고 싶은데 티비가 너무 웃겨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남편은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며 옆에 앉았다. 그리고 1분도 안돼 나보다 더 큰 소리로 숨 넘어갈 듯이 웃어대기 시작했다. 아이가 깨면 뭐 또 재우면 되지. 둘이 나란히 방바닥에 앉아 티비를 코앞에 두고 같은 마음이 되어 한참을 함께 웃은 순간. 육아로 너무 힘이 들 때면 그때를 생각한다. 남편도 많이 힘들겠지. 그래, 같이 힘을 내보자 하고. 꼬맹이는 추석 연휴가 지나자 혼자서 뒤집기 시작했다. 어제오늘 뒤집기 지옥이었다. 오늘 나는 저녁밥을 먹고 어김없이 커피숍에 들어갔고 남편이 아이와 놀아주다 급하게 나를 불렀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 손으로 모빌 인형을 툭툭 치게 하자 아이가 자지러지게 웃었다. 까르르까르르- 그 웃음에 나도 남편도 함께 웃었다. 그래, 너도 세상 적응이 쉽지 않겠지. 우리 같이 힘을 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