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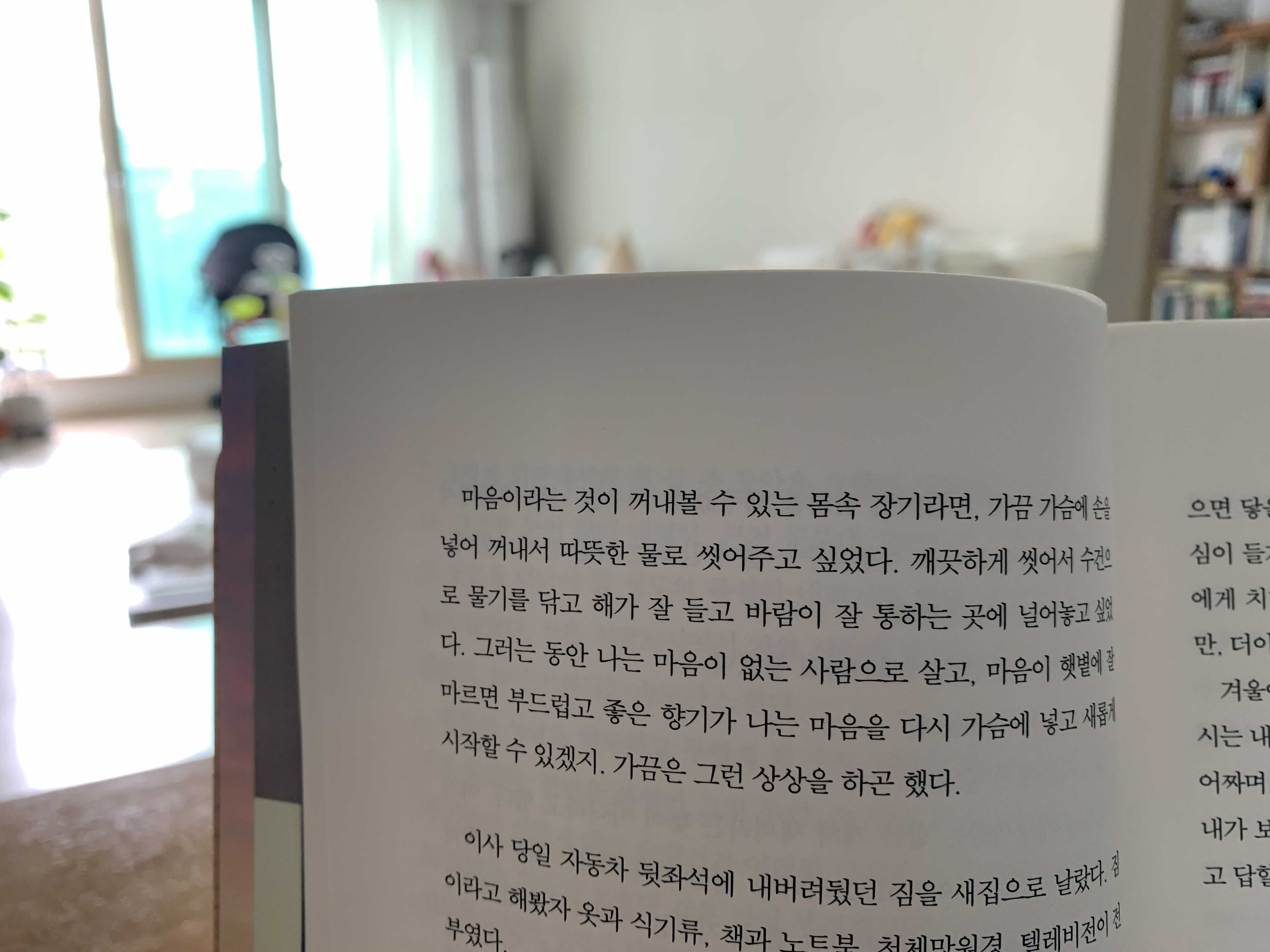

아이가 백일이 되기 전이었다. 몸과 마음이 한창 지쳐있던 때. 조금 외로웠던 밤이었는데 완전히 혼자 있고 싶어 반신욕을 했다. 그 즈음 매일 밤 반신욕이 간절했다.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은 봄이가 선정한 시옷의 책이었는데 출간되자마자 읽으려고 사두었었다. 책을 가지고 들어가 따뜻한 물 속에 몸을 담그고 오래 있었다. 두번째 챕터 마지막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증조모는 열일곱일 때 살기 위해 엄마를 버려야 했다. 병에 걸려 곧 죽을 것이 분명한 엄마를 자신이 살기 위해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간다고 하자 엄마는 말했다. "기래, 가라. 내레 다음 생에선 네 딸로 태어날 테니. 그때 만나자. 그때 다시 만나자." 증조모의 딸, 그러니까 주인공의 할머니는 병에 걸린 자신의 엄마 증조모가 자신을 보며 두 팔을 쭉 내밀며 했던 말을 잊지 못한다. "어마이, 어마이 왔어?" 엄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증조모, 자식의 딸로 다시 태어난다는 고조모, 병에 걸려 딸을 엄마라고 부르는 증조모. 서럽게 외롭고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이 정말 환생된 걸까. 이런 생각에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 위안이 되는 밤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책이었다.
추석에 남편이 거래처에서 주었다며 커다란 멜론 세 개를 가져왔다. 남편은 과일을 좋아하지 않고 이 세 개를 제때 맛있게 다 먹기란 불가능한 일. 가까이 있었으면 나눠 주었을 사람들이 생각났다. 새삼스레 참 멀리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 아쉬웠지만 내가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아직도 그들을 생각한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웠다. 내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밝은 밤>을 떠올렸다. <밝은 밤>은 곁에 있는, 혹은 멀리 있는 힘이 되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이다. 좋았고 좋았다. 마지막 장을 넘기고 이 작은 책을 얼마동안 가만히 품에 안아주고 싶었다.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리고 고마워.
-
나는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 엄마. 사람들이 트랙터로 밭을 갈고 있네. 무언가를 심으려고 하나봐. 여름이랑 가을에는 바깥 풍경이 볼만하겠다. 재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 아무도 겨울 밭을 억지로 갈진 않잖아.
- 16쪽
며칠 지나지 않아 마트 앞에서 할머니와 우연히 만났다. 나는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아파트로 바로 돌아가는 대신에 시내를 한 바퀴 돌았다. 할머니는 차창을 내리고 부드러운 봄바람을 맞았다. 바람에 할머니의 짧은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날렸고 천변에는 꽃들이 한창이었다. 라디오에서는 주현미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밤공기에 옅은 꽃향기가 섞여 있었다. 기분 좋은 바람. 온전한 봄밤이었다. 할머니는 허밍으로 노래를 따라 했다.
- 70쪽
연재를 앞두고도 내가 어떤 소설을 쓰게 될지 알지 못했다. 그 무렵 어느 작가 레지던스에 머물 기회를 얻었다. 방에 짐을 풀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모니터를 마주한 순간을 기억한다. 창밖으로 보이던 눈 쌓인 벌판과 한없는 고요함. 그곳에 앉아서 나는 <밝은 밤>을 쓰기 시작했다. 그 기분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날 나는 다시 쓰는 사람의 세계로 초대받았고, 그곳에서 삼천이를 만났다.
- 341쪽, 작가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