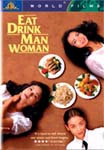인터넷 서점을 뒤지다가 삼천원 아래의 가격인데, 언젠가 한 번 보고 싶었던 혹은 누군가 이 영화가 참 좋더라고 말을 했던 DVD를 보게 되면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책을 한 권 살 때 같이 산다. 그러곤 책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가 문득 시간이 남아 돌아 뭘 해야할 지 모르겠는데, 그 깊숙한 책장 쪽으로 눈이 갈 때 슬쩍 꺼내서 보곤 한다. 그렇게 본 삼천원 아래 가격의 DVD들은 대부분 좋았다. 어제도 그런 날이었고, 그러다 책장에 눈이 갔고, 그 곳에 꽂혀져 있던 <음식남녀>를 봤다. 나는 이안 감독을 좋아하니까(<브로크백 마운틴> 때문이지) 이 영화도 좋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 오프닝 장면에서부터 마음을 뺏겼다.
따닥따닥. 지이익. <음식남녀>의 오프닝은 아버지가 일요일 만찬을 준비하는 장면이다. 살아있는 커다란 잉어 같은 생선의 입에 젓가락을 꽂아 순식간에 힘을 주고 생선을 죽인 뒤,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된다. 따닥따닥. 지이익. 생선의 내장을 빼내고, 살을 발라내고, 그걸 튀기고, 소스를 만들어 얹고. 닭을 잡아 목을 비튼 뒤, 그걸 끓이고. 서른 명이 먹어도 될 만한 양의 음식들을 아버지 혼자서 아주 능숙하게 요리해낸다. 내가 제일 감탄했던 그의 손놀림은 고추의 씨를 빼내고 썰어내는 장면, 무채를 써는 장면이다. 그 손놀림이 얼마나 노련한지 그 요리를 먹어보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영화는 아버지와 세 딸의 이야기다. 오래전에 아내와 사별한 무뚝뚝한 성격의 아버지는 요즘 점점 미각을 잃어간다. 그렇다고 장금이처럼 미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울부짓는 건 아니다. 그저 자신의 요리를 맛보는 이의 얼굴을 살피고, 그이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미묘한 표정에 조금씩 절망할 뿐이다. 그래도 그는 계속 음식을 만든다. 일요일 만찬은 세 딸과 아버지가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는 항상 30인분의 요리를 만들어 내놓고, 이제는 훌쩍 커버린 딸들의 '할 말이 있어요'따위의 사연을 듣는다. 딸들이 '할 말이 있어요'라고 내뱉는 건, 이 집을 떠나겠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이고, 더이상 일요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게 딸들은 자라고, 아버지는 늙어간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버지 주사부가 친구의 요청으로 호텔의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어낸 뒤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만두 앞에 친구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는 장면이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뭐, 이제 늙었다, 음식맛이 점점 안 느껴진다, 그래도 니 요리는 최고다, 베토벤을 떠올려봐라, 요리비법을 적은 책을 만들어라,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식이다. 그 때의 두 늙은이의 표정, 노동 후 들이키는 한 잔의 술, 그 뒤로 한 때는 뜨끈뜨근했을 만두가 차갑게 식어 쓰레기통으로 바로 직행하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은 주방을 빠져나와 텅 빈 복도를 걷는다. 술에 취해 비틀비틀. 서로에게 의지해서 어깨동무를 한 채. 카메라는 그들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장면은 주사부가 그들과 가족같이(!) 지내는 첫째 딸의 친구, 금영의 딸에게 매일 도시락을 싸 주는 장면. 금영의 맛없는 도시락은 주사부가 먹어치우고, 주사부는 매일 학교로 찾아가 손녀뻘인 아이에게 화려한 도시락을 전해준다. 친구들은 그런 아이를 부러워하고, 아이는 주사부에게 단짝의 도시락도 함께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묻는다. 주사부는 그럼, 재료가 더 넣으면 된단다, 허락하고. 아이는 친구들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물어보고 그 쪽지를 주사부에게 건네준다. 그러면 주사부는 아이에게 뜨끈뜨끈한 도시락을 건네준다. 나도 누군가 내가 만든 요리를 아주 맛있게, 그릇을 싹싹 비울 정도로 맛있게 먹어주는 게 좋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건 그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나는 안 먹어도 배 부른 엄마의 마음. 나는 화려한 일요일 만찬을 깨작거리며 먹는 딸들보다 아이의 도시락이 더 탐스러웠다. 나도 아이의 옆에 앉아 그 스탠 도시락을 함께 나눠먹고 싶었다.
영화는 아버지 주사부가 미각을 되찾으면서 끝이 난다. 둘째 딸 오천련이 만들어 준 음식을 맛보고 난 뒤다. 생강을 너무 맛이 썼다고 투덜대던 주사부는 이내 맛이 느껴진다며 미소 짓는다. 그리고 오천련의 손을 잡는다. 영화는 여기서 끝. 마지막이 너무 엔딩답지 않게 끝나서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해피엔딩이었다. 딸 둘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고, 딸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늘 갈망했던 요리를 시작했다. 아버지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부엌에서 아버지를 위한 요리를 시작하면서부터. 괜찮은 결말이었다. 따뜻한 영화였다. 아, 그리고 이 영화는 반전영화다. 영화의 후반부에 깜짝 놀랄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유쾌한 영화이기도 하다. 아, 갑자기 아빠가 만들어주던 일요일 아침의 토스트가 먹고 싶어졌다. 버터 듬뿍의. 그건 우리 아빠의 일요일 만찬이었던 거구나. 그리운 맛.